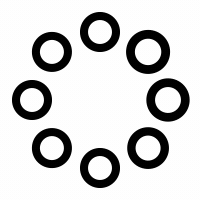-
![[세트] 엎드리는 개 + 해독 일기 - 전2권](/kaibook/common/images/bookcover.jpg) [세트] 엎드리는 개 + 해독 일기 - 전2권
프랑수아즈 사강 지음, 김유진 옮김
자동차 사고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모르핀 중독에 빠진 프랑수아즈 사강의 해독 일기.섬세하면서도 감상적이고 우울한 분위기,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는 법정에서의 진술, 마약, 담배, 감수성 짙은 싸이월드나 인스타그램 포스팅이 떠오르는… 정도가 한 번도 그의 책을 읽지 못해본 내가 프랑수아즈 사강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였다.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인상은 사뭇 달라졌다.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18세에 발표한 작품으로 데뷔와 동시에 프랑스 문단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세간의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된다.문학적 재능에 더해진 자유롭고 반항적인 삶의 모습에 사람들은 열광했다.데뷔작에 주어진 상금으로 재규어 XK140을 사고 파리 시내를 질주한다.샴페인, 파티, 칵테일, 담배, 마약, 도박. 파티에 파티.마세라티, 페라리, 머스탱을 구매한다.사고가 났을 때 그는 애스턴 마틴에 올라 있었다.온 몸에 골절과 타박상을 입고 몇 차례의 대수술을 받고 모르핀에 중독된다.쾌락과 고통은 이어진다…작중에서 해독은 후회나 자기 연민, 부정과 배제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그는 겪고 느낀대로 지면에 옮긴다.지면 위의 활자는 삶을 비춘다.정돈되지 않은 기억들은 나름대로의 자리를 찾고 상을 맺고, 비로소 해독에 이른다.글이 짧고 여백이 많다.슥슥 넘기다 보면 금방 읽을 수 있다.하지만 천천히 음미하면서 떠오르는 이미지, 생각, 그리고 이야기들로 여백을 채우며 읽을 것을 권한다.쓰디쓴 약초를 우려낸 차를 병상 위의 사강과 나누어 마시는 기분으로.
[세트] 엎드리는 개 + 해독 일기 - 전2권
프랑수아즈 사강 지음, 김유진 옮김
자동차 사고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모르핀 중독에 빠진 프랑수아즈 사강의 해독 일기.섬세하면서도 감상적이고 우울한 분위기,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는 법정에서의 진술, 마약, 담배, 감수성 짙은 싸이월드나 인스타그램 포스팅이 떠오르는… 정도가 한 번도 그의 책을 읽지 못해본 내가 프랑수아즈 사강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였다.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인상은 사뭇 달라졌다.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18세에 발표한 작품으로 데뷔와 동시에 프랑스 문단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세간의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된다.문학적 재능에 더해진 자유롭고 반항적인 삶의 모습에 사람들은 열광했다.데뷔작에 주어진 상금으로 재규어 XK140을 사고 파리 시내를 질주한다.샴페인, 파티, 칵테일, 담배, 마약, 도박. 파티에 파티.마세라티, 페라리, 머스탱을 구매한다.사고가 났을 때 그는 애스턴 마틴에 올라 있었다.온 몸에 골절과 타박상을 입고 몇 차례의 대수술을 받고 모르핀에 중독된다.쾌락과 고통은 이어진다…작중에서 해독은 후회나 자기 연민, 부정과 배제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그는 겪고 느낀대로 지면에 옮긴다.지면 위의 활자는 삶을 비춘다.정돈되지 않은 기억들은 나름대로의 자리를 찾고 상을 맺고, 비로소 해독에 이른다.글이 짧고 여백이 많다.슥슥 넘기다 보면 금방 읽을 수 있다.하지만 천천히 음미하면서 떠오르는 이미지, 생각, 그리고 이야기들로 여백을 채우며 읽을 것을 권한다.쓰디쓴 약초를 우려낸 차를 병상 위의 사강과 나누어 마시는 기분으로.
-
-
-
![[세트] 엎드리는 개 + 해독 일기 - 전2권](/kaibook/common/images/bookcover.jpg) [세트] 엎드리는 개 + 해독 일기 - 전2권
프랑수아즈 사강 지음, 김유진 옮김
“프루스트를, 스완의 열정을, 행복해하며 다시 읽는다. 진정한 행복은, 진실과 산문이 일치하는 순간처럼 드문 일이다. 나는 문학에서 발명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게 내가 포크너를 읽으며 한 번도 진짜로 감동을 받은 적이 없는 이유다. 그가 만들어낸 괴물들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 눈에 대서양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77쪽, <해독 일기> 중) 프랑수아즈 사강이라는 작가를 처음 의식하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읽으면서였다. 텍스트만으로도 시끄러운 듯한 시몽의 열렬한 구애를 떠올리며, 사람과 사람 간의 이끌림에 대해서 섬세하고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작가라고 여김과 동시에, 고독한 상태에 대해서 쓰는 사강에 대해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다. 자신의 존재를 감각하며 문장을 끌어내는 작가들이 있는 반면, 프랑수아즈 사강의 문장의 경우 타인의 얼굴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비로소 인지하는 작가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독 일기>가 쓰여진 방식이 더 흥미로웠던 것 같다. 사강은 고독할 때조차 자신에 대해서 쓰기보다는, 자신의 몸과 대화하듯이 글을 쓴다고 느낀다.
[세트] 엎드리는 개 + 해독 일기 - 전2권
프랑수아즈 사강 지음, 김유진 옮김
“프루스트를, 스완의 열정을, 행복해하며 다시 읽는다. 진정한 행복은, 진실과 산문이 일치하는 순간처럼 드문 일이다. 나는 문학에서 발명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게 내가 포크너를 읽으며 한 번도 진짜로 감동을 받은 적이 없는 이유다. 그가 만들어낸 괴물들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 눈에 대서양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77쪽, <해독 일기> 중) 프랑수아즈 사강이라는 작가를 처음 의식하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읽으면서였다. 텍스트만으로도 시끄러운 듯한 시몽의 열렬한 구애를 떠올리며, 사람과 사람 간의 이끌림에 대해서 섬세하고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작가라고 여김과 동시에, 고독한 상태에 대해서 쓰는 사강에 대해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다. 자신의 존재를 감각하며 문장을 끌어내는 작가들이 있는 반면, 프랑수아즈 사강의 문장의 경우 타인의 얼굴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비로소 인지하는 작가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독 일기>가 쓰여진 방식이 더 흥미로웠던 것 같다. 사강은 고독할 때조차 자신에 대해서 쓰기보다는, 자신의 몸과 대화하듯이 글을 쓴다고 느낀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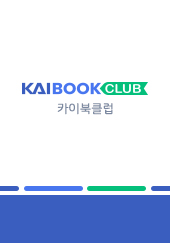 어두운 밤 나는 적막한 집을 나섰다
페터 한트케 지음, 윤시향 옮김
‘탁스함에 그와 같은 이름을 갖는 약사가 있다면 그것은 우연일 것이다.’하지만 책이 끝날 때까지 그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장난인지 거짓말인지 환상인지 책 속의 현실인지 알기 어렵다.탁스함의 약사도 그랬을 것 같다.이 아저씨는 엄청난 후각을 가지고 독특한 버섯을 찾아 먹는 취미의 소유자인 동시에 집나간 아들과 독립해가는 딸, 말도 잘 섞지 않고 마주치지도 않는 아내를 두었다.또다른 취미는 서사시 읽기이다.탁스함이라는 낯선 지명과 버섯 캐기와 서사시라는 취미를 조금 비틀어 생각해보면, 포천쯤 사는 무협지 좋아하는 약사 아저씨처럼 보이기도 한다.완전히 혼자 남겨진 그는 서사시를 읽다 집을 나서 직접 서사시를 겪게 된다.풀숲에서 후려 맞고 말을 잃어버리면서 시작된 그의 여정은 어느 새벽 미망인에게 흠씬 두들겨 맞으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수상하지만 신비롭지는 않은 두명의 동행인과 그는 산타페에 도착해서 아들 딸의 사랑도 목격하고 마을 소일거리도 하면서 낡은 새 삶을 찾는다.약사는 여전히 말을 못하고, 되찾고 싶어하지도 않는다.이끌리듯이 떠난 스텝 지역에서의 여정은 빨리 감기처럼 지나간다.이상한 장면들과 온갖 내음이 스쳐간다.그리고 그는 메마른 들에서 마침내 그가 좇던 미망인의 목소리를 듣는다.목소리는 그의 실어 상태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말한다.정말?알 수 없지만, 그 대목 이후에 약사는 스텝을 마저 건너고 달음박질하여 문명으로 돌아온다.탁스함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몸을 싣고 집에 돌아와 서사시를 다시 집어들고, 말을 되찾는다.이야기는 백일몽 같다.어쩌면 약사는 탁스함을 떠난 적도 없고, 이 모든 이야기는 철저히 혼자 남겨진 어느 주말에 목적지 없이 산책하고 버스에 올라 하염없이 졸면서 그려낸 꿈일지도 모른다.아니면 혼자 산타페 여행을 다녀오며 자투리 시간마다 지어낸 상상일 수도 있다.말 할 사람도 할 말도 없어 다문 입을 실어 상태라고 스스로에게 얼버무렸는지도 모른다.하지만 허구인지 변명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두들겨 맞는 것은 나쁜가?실어는 부자유 혹은 기만적 자유인가?영속적인 것은 없다. 이야기는 죽음에서 출발해서 수용과 해소로 잦아든다.여정 속에서 약사는 격렬한 충격으로 시작해서 점점 은은한 내음의 형태로 자유와 죽음, 이별을 받아들인다.후일담에서 그는 침이 많이 튀길 것으로 예상되는 흥분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떠벌인다.돌아온 그의 삶이 또렷하게 새롭지는 않지만, 촛불처럼 명료한 생명력을 품고 있음이 느껴진다.죽음의 사자처럼 보이는 까마귀의 역할이 하나가 아닌 것처럼, 삶과 죽음은 대비되지 않고 실어는 언어를 배척하지 않는다.맞고 듣고 냄새맡으면서 되찾은 그 생명을, 그리고 직접 캔 버섯 요리를 언젠가 우리도 맛볼 수 있기를 바란다.
어두운 밤 나는 적막한 집을 나섰다
페터 한트케 지음, 윤시향 옮김
‘탁스함에 그와 같은 이름을 갖는 약사가 있다면 그것은 우연일 것이다.’하지만 책이 끝날 때까지 그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장난인지 거짓말인지 환상인지 책 속의 현실인지 알기 어렵다.탁스함의 약사도 그랬을 것 같다.이 아저씨는 엄청난 후각을 가지고 독특한 버섯을 찾아 먹는 취미의 소유자인 동시에 집나간 아들과 독립해가는 딸, 말도 잘 섞지 않고 마주치지도 않는 아내를 두었다.또다른 취미는 서사시 읽기이다.탁스함이라는 낯선 지명과 버섯 캐기와 서사시라는 취미를 조금 비틀어 생각해보면, 포천쯤 사는 무협지 좋아하는 약사 아저씨처럼 보이기도 한다.완전히 혼자 남겨진 그는 서사시를 읽다 집을 나서 직접 서사시를 겪게 된다.풀숲에서 후려 맞고 말을 잃어버리면서 시작된 그의 여정은 어느 새벽 미망인에게 흠씬 두들겨 맞으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수상하지만 신비롭지는 않은 두명의 동행인과 그는 산타페에 도착해서 아들 딸의 사랑도 목격하고 마을 소일거리도 하면서 낡은 새 삶을 찾는다.약사는 여전히 말을 못하고, 되찾고 싶어하지도 않는다.이끌리듯이 떠난 스텝 지역에서의 여정은 빨리 감기처럼 지나간다.이상한 장면들과 온갖 내음이 스쳐간다.그리고 그는 메마른 들에서 마침내 그가 좇던 미망인의 목소리를 듣는다.목소리는 그의 실어 상태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말한다.정말?알 수 없지만, 그 대목 이후에 약사는 스텝을 마저 건너고 달음박질하여 문명으로 돌아온다.탁스함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몸을 싣고 집에 돌아와 서사시를 다시 집어들고, 말을 되찾는다.이야기는 백일몽 같다.어쩌면 약사는 탁스함을 떠난 적도 없고, 이 모든 이야기는 철저히 혼자 남겨진 어느 주말에 목적지 없이 산책하고 버스에 올라 하염없이 졸면서 그려낸 꿈일지도 모른다.아니면 혼자 산타페 여행을 다녀오며 자투리 시간마다 지어낸 상상일 수도 있다.말 할 사람도 할 말도 없어 다문 입을 실어 상태라고 스스로에게 얼버무렸는지도 모른다.하지만 허구인지 변명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두들겨 맞는 것은 나쁜가?실어는 부자유 혹은 기만적 자유인가?영속적인 것은 없다. 이야기는 죽음에서 출발해서 수용과 해소로 잦아든다.여정 속에서 약사는 격렬한 충격으로 시작해서 점점 은은한 내음의 형태로 자유와 죽음, 이별을 받아들인다.후일담에서 그는 침이 많이 튀길 것으로 예상되는 흥분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떠벌인다.돌아온 그의 삶이 또렷하게 새롭지는 않지만, 촛불처럼 명료한 생명력을 품고 있음이 느껴진다.죽음의 사자처럼 보이는 까마귀의 역할이 하나가 아닌 것처럼, 삶과 죽음은 대비되지 않고 실어는 언어를 배척하지 않는다.맞고 듣고 냄새맡으면서 되찾은 그 생명을, 그리고 직접 캔 버섯 요리를 언젠가 우리도 맛볼 수 있기를 바란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