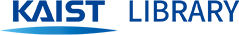Empathy enables us to share and understand the feelings of others, and it is a necessary ability for social animal such as human. Empathy had been considered as a unique trait of mankind; hence most of research had focused on human-beings. In recent years, empathy has been studied in rodents to unveil the neural mecha-nism in many quarters. However, neural basis of empathy has not been investigated enough from the standpoint of acquired characteristic, such as social memory acquisition and development. To study the acquired characteristic of empathy, two hypotheses were established and behavioral experiments with mice were performed.
First, memory formation through social interaction will be necessary for the expression of empathy. Thus CaMKIIα+/- mice which have a deficit in memory retention are expected to be unable to show empathy. Sec-ond, if accumulation of social experiences is needed for empathy maturation, empathic response will not be elicited enough in the early age. Hence, higher level of empathy is expected to be observed in adult mice than in juvenile mice. Observational fear learning was employed as a behavioral assay to assess the level of empathy.
In the result of experiments, CaMKIIα+/- mice showed impairment in observational fear learning. Deficit of CaMKIIα+/- mice in observational fear learning was confirmed to be independent of fear response and hyper-activity. In addition, increased level of response was observed in adult mice compared to juvenile mice. Low level of empathic response in juvenile mice was unrelated to the immaturity of fear response in early age.
In conclusion, both memory deficit and lack of social experience resulted in decreased level of empathy. These behavioral results of mice are the first studies about the acquired characteristics of empathy in terms of age and memory so far. The results imply that not only innate genetic component but also memory acquired by social interaction with surrounding environments through developmental progress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empathy. Though, questions of what kind of memory must be exactly formed and maintained in what time period and in what region for maturation of empathy should be solved in further studies. These exertion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scientific comprehension of empathy and to methodology in the cultivation of empathy.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공감 능력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공감은 고등 영장류의 전유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관련 연구들은 인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 설치류에서도 공감 반응이 관찰되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실험 동물을 대상으로 공감에 대해 연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공감에 대한 보다 폭넓은 신경과학적 접근이 가능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축적되는 사회적 경험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즉 공감의 후천적 요소에 대한 신경학적 기전을 밝히기 위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감의 후천성에 대해 탐구하기 위해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생쥐를 이용한 행동 실험을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첫째, 함께 생활하는 동종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인 기억이 공감의 발현에 필수적일 것이다. 따라서 기억 유지 능력이 결핍된 CaMKIIα+/- 돌연변이 생쥐는 공감을 보이지 못할 것이다. 둘째, 만약 공감 능력의 발달에 사회적인 경험들의 축적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경험이 부족한 어린 연령의 쥐에게서는 공감 반응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린 생쥐에 비해 어른 생쥐에게서 더 높은 수준의 공감이 관찰될 것이다. 공감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행동 실험의 일종인 관찰 공포 학습 (observational fear learning) 을 이용하였다.
첫 번째 실험 결과에서 CaMKIIα+/- 돌연변이 생쥐는 정상 생쥐에 비해 관찰 공포 학습에 큰 장애를 보였으며, 이러한 차이가 돌연변이 생쥐의 과잉 행동에 의한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다. 직접적인 공포 학습에 있어서는 해당 돌연변이 생쥐와 정상 생쥐 간 차이가 없음을 검증하였다. 두 번째 실험 결과에서는 어른 생쥐에게서 어린 생쥐에 비해 증가된 수준의 공감 반응이 관찰되었다. 낮은 공감 반응을 보인 어린 생쥐들은 일반적인 공포 반응에서 어른 생쥐들에 비해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공포 기억 수준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어린 생쥐들이 보이는 낮은 수준의 공감이, 공포 반응의 미성숙과 같은 원인에 기인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기억 결핍과 사회적 경험의 부족은 모두 생쥐에게서 낮은 공감 수준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생쥐의 행동 실험 결과는 공감의 후천성에 관한 연령과 기억 관점에서의 첫 보고이다. 본 연구 결과는 공감의 발달 및 형성에 있어서, 타고난 유전적 요소뿐만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의 사회적 주변 환경과의 교류를 통한 기억 형성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공감 능력의 함양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기억이 어느 시점에 어떤 뇌 부위에서 실제로 형성되고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후속 연구를 통해 해결될 것이며, 이를 통해 공감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더불어 공감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회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